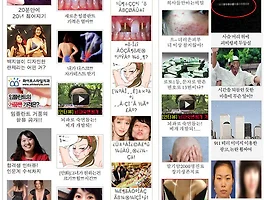이 글도 책을 읽으면서 적흥적으로 생각난 것을 적습니다. 몇 분이 끝까지 읽어주실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읽으셔도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현상만, 그리고 그런 현상에서 느꼈던 제 감정만 나열할 뿐입니다.
'풍요'라는 말이 제 인식 속에 들어온 것은 앨빈 & 하이디 토플러 Alvin & Heidi Toffler의 <부의 미래 Revolutionary Wealth>를 읽으면서 였습니다. 책의 전반부에 현재 진행중인 세계의 트렌드로 3A, 즉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Asia의 부상, 식료품 등을 포함한 많은 제품들의 풍요 Abundance, 그리고 모든 산업 및 생활의 자동화 Automation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시아와 자동화에 대한 얘기는 자주 접했지만, 풍요에 대한 개념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것이, 저희가 배우는 모든 것들, 아니 인류가 이룩한 대부분의 것들이 풍요에 대한 것이 아니라 빈곤에 대한 것입니다. 즉, 빈곤을 바탕으로, 빈곤을 기본 가정으로 전제한 후에 이론이나 모델들이 정립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의 제1원칙은 '최소 비용에 최대 효과'가 바로 빈곤 문제 (제한된 리소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도 당연한 것이 20세기에 이르기까지 항상 식량의 부족, 노동력의 부족, 지식의 부족 등의 모든 면에서 부족, 부족,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한계 constraint에 가로막혀있었기 때문에, 이런 빈곤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필요했고 그런 필요에 따라서 경제학이 발전해왔습니다. 이는 스케일이 조금 다를뿐, 미시경제나 거시경제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또 빈곤을 전제로 발전된 것이 '최적화' (저는 산업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귀에 박히도록 들은 내용입니다.)입니다. 최적화라는 것도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대/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이 최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onstraints가 없는 최적화 문제/해결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껏 우리가 다루어왔던 대부분의 난제들은 바로 빈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달려있었던 것같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래밍에서도 어떻게 하면 메모리를 조금 사용하면서 더 빨리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궁리했습니다. 메모리의 빈곤, 시간의 빈곤, 퍼포먼스의 빈곤,... 빈곤이 우리의 이웃/친구였다는 것을 부정한다면, 인류의 역사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 오랜 기본 가정을 깨어준 것이 <부의 미래>에서 지금은 그리고 미래는 '풍요의 시대'라고 말해줬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11월에 학교에 가서 (산공과) 후배들에게 'Exact Optimal is not Optimal'이라는 말도 해줄 예정입니다. 역석적인 위의 명제가 풍요의 시대에는 맞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구글에서 Scarcity (빈곤)을 검색하면 28,500,000 건의 검색결과가, Abundance (풍요)를 검색하면 28,100,00 건의 검색결과가 나오네요. 둘 사이에 검색건수가 많이 차이가 날줄 알았는데, 조금 의외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풍요' 문제를 접했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책이나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할 문제는 더이상 빈곤이 아니라, 풍요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재의 디지털 시대/경제에서는 더이상 빈곤이 존재하지 않는 것같습니다. Bit로 표현되는 정보는 거의 무제한으로 생산되고, 복재가 되고, 배포/유통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나 데이터센터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10년 20년 전에 가졌던 그런 스토리지의 빈곤이 지금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글과 관련된 책들 (최근에 <구글노믹스>를 읽는 중)을 보면, 디지털 시대에는 정말로 빈곤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글이 성공한 것은 좋은 알고리즘 (페이지랭크)을 바탕으로한 최적화된 검색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빈곤한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풍요의 세상을 봤기 때문에 성공한 것같습니다. 비슷하게,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의 성공한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풍요'를 보았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고전이 되어버린 Wired의 편집장인 크리스 앤더슨 Chris Anderson의 <롱테일 경제학 The LongTail>도 바로 이 풍요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 여전히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빈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으니, 오해/곡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풍요' 현상에 대해서 최근에 읽은 몇 개의 기사가 생각납니다. The Economist에서 실린 <Data, data everywhere (현재 유료구독)>입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데이터의 풍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는데는 기존과 같이 최적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별로 맞지가 않다라는 견해를 밝힙니다. 실제, 그런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할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현상'만을 보고 현상만을 설명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회사의 많은 문제들을 복잡한 수식으로 풀기보다는 단순히 사칙연산 수준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만 뽑아내는데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초)대용량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분석방법/기술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그런 데이터 (현상)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오늘날의 데이터마이너들에게 더 필요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는 2008년도에 <Wired>에 실린 <The End of Theory: The data deluge makes the scientific method obsolete.>입니다. 아, 이실직고를 하자면 앞서 말한 '데이터를 (과학적/수리적 방법으로) 분석할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라'는 얘기는 이 Wired 기사에서 다루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더 덧붙이자면 2010년 2월의 <Wired>에 실린 <How Google's Algorithm Rules the Web>도 궁극적으로 풍요의 웹에서 구글이 살아남은/성공한 비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구글의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 더 적합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초)대용량 데이터를 구글이 다루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담이지만, Collective Intelligence가 지고 Social Intelligence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Collective Filtering을 이용했다면, 페이스북은 Social Filtering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Social은 Collective보다 규모가 엄청 작은 것을 다루는 것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Sociality를 뽑아내는 과정이 구글이 다루는 데이터의 규모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계산과정에서는 더 복잡합니다. 몇 가지 가정들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글에서 '풍요'를 소개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풍요를 바탕으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도 이 풍요의 문제를 다각도로 보고 저의 한계 내에서 풍요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빈곤의 문제는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지 성공할 수 있었지만, 풍요의 문제는 하나만 잘 해결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앞서 말했던 구글, 아마존, 이베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등등 입니다. 그리고, '풍요'의 문제에서 여전히 '빈곤'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상상력의 빈곤'입니다. 풍요의 시대에 가장 부족한/빈곤한 자원이 '상상력/창의성'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하고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제발 모두 '상상력/창의성의 풍요'를 이룩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